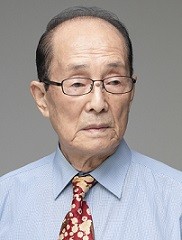 |
하지만, 미(美)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적출사항이 없어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나 세무조사 결과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니 우리네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無)실적 조사는 개인의 경우 11.74%, 법인은 27.67%에 이르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6,305건의 ‘환급결정’으로 813,252천 달러의 환급세액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청정한 세정, 우리네 세무조사 환경과 비교할 때 놀라움과 함께 부럽기 그지없다.
허긴 우리네 국세당국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행정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특히나 세무조사의 신중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과 조사관리팀이 통합된 '정보관리팀'을 슬림화해 신설하면서 우수정보요원(BIO-Best Intelligence Officer)들을 배치했다. 이른바 BIO 요원들로 하여금 선제적인 세정지원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음성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현미경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탈세정보 수집과 함께 이를 분석하고, 탈세·차명계좌 제보를 접수하는 등 기존 ‘세원정보팀’과 ‘조사관리팀’의 기능을 통합했기에 지능적인 음성 탈루행위 대응에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네 조사행정은 너무나 공격적인 측면이 강한 게 흠이다.
탈세행위에 대한 현미경식 대응도 중요하다만, 조사요원들의 과욕으로 인한 부실부과가 발생치 않도록 조사행정의 엄정성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래서 고개를 든다.
먼저,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아리송한 현행 세법규정과 당무자들의 조정력 빈곤이 세정의 신뢰를 떨군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의 승산이 뻔한 사안마저도 사후귀책이 두려워 일단 과세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조세마찰을 자초하는 국세당국의 자충수(自充手)이자 경직세정이 가져다주는 폐해이기도다.
여기에 과세처분의 적정여부를 놓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할 관리자들이 예민한 사안에는 몸을 너무 사린다는 전언이다. 나름의 논리를 피력하다가 공연한 오해를 불러드릴세라 소신(所信)대신 보신(保身)을 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인들이 토로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현재의 아쉬움이기도 하다.
관리자들의 경직된 세정운영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조사요원들이 특정기업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다고 판단, 결제라인에 올린 조사복명서를 계속 퇴짜 놓는 경우다. 자연 해당 기업에 마른 수건 짜듯 무리한 프레스가 가해지기 마련이다. 조사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동시에 싹트는 순간이기도 하다.
조사요원 일각의 ‘터프’한 매너도 관리자들의 엉거주춤한 스탠스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소신을 저버리는 조직이라면 BIO 같은 유능한 인력을 애써 포진한들 효험이 별무다.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선의의 재량권’을 부여,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소신껏 세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대두된다.
공격적인 세무조사에 앞서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가 종결되는’ 반듯한 조사행정이 자리 잡아야 비로소 납세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우리에겐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無)실적’ 또는 ‘환급결정’으로 종결되는 그런 청정한 세정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국세행정 최고책임자의 소신결핍이 문제인가. 국세당국과 납세국민 모두 함께 풀어내야 할 공통과제가 아닌가 싶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