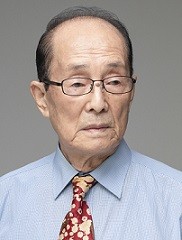 |
#필자의 현장기자 시절의 일이다. 어느 봉제회사 창고에 큰 불이 나 창고 안에 쌓아 두었던 의류 수천 벌이 소실(燒失)된다. 손실액이 지금의 화폐가치로 50여억 원에 달하는 큰 화재였다. 당연히 그 기업은 화재 손실액을 계상, 법인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관할 세무서는 손실액을 전액 부인, 법인세를 고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그 기업 사장, 헐레벌떡 관할 세무서를 찾아 갔지만 그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동서의 간부진이다. 말단 직원의 법인세결의서가 아무런 검증 없이 주무→ 과장→ 서장의 전 결제라인을 무사통과 그대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정도 손실규모라면 아무리 ‘남의 일(?)’이라 해도 한번쯤 챙겨 볼만도 했는데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이 눈 감고 도장만 꾹꾹 눌렀다는 얘기가 된다. 최소한의 양식 있는 간부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었던들 결제 단계에서 당연히 걸러졌을 사안이다. 당시 담당 과장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직원의 판단을 믿었노라”고―. 이 건은 그 후 불복청구를 통해 해결됐음은 물론이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런 관리자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요즘도 결은 다르지만 조직 상· 하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음을 실감한다. 때로는 과거의 안일한 케이스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세무대리인이 조력(助力)을 구하는 고객(납세자) 위임에 의해 관서를 방문할 경우 ‘청탁’과 ‘청원’을 구분치 못하는 관리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납세기업에 억울함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달라는 정중한 청원마저도 “요즘 직원들 어디 말 듣습니까”로 대화를 자른다는 얘기다. 실은 청탁이 아닌데도 말이다. 정정당당해야 할 공적 시시템이 사적 감정에 주늑드는 듯한 이 발언에서 조직·상하간 장벽은 물론, 현실의 심각성을 느낀다. 이러한 현장 기류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인들이 느끼는 공통된 아쉬움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관리자’로서의 역할 포기에 가깝다. 소임 회피가 정도를 넘으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다. 이렇듯 관리자들이 부하직원 두려워 소신(所信) 피력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면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조사파트 내에서 관리자들의 소심증이 유별난 것 같다.
#오뉴월에도 오금을 시리게 한다는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사업자들에겐 위협적인 존재다. 여차할 경우 기업의 기둥뿌리 빠지는 게 바로 세무조사다. 한마디로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우리네 납세환경 상 아직은 국세행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납세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인지상정이라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측은 일단 생사기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게 마련이다. 지연(地緣)이나 학연(學緣) 등 모든 연(緣)을 총동원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논리의 정당성 관철을 위한 최대한의 자기방어 수단일 뿐,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것이 아이다. 관리자들에겐 다소의 심리적 압박이 될지언정, 피해서는 아니 될 통과의례다. 사적인 연(緣)에 좌지우지될 당국도 아니지만 조사파트 관리자들에게 특단의 ‘조정력’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다. 조세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세원(稅源) 말살을 막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일이야 말로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세상사 모든 일은 ‘법(法) 대로’ 보다는 '법의 운영'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가해지는 강성, 악성 민원은 과세처분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과정에서 야기된다. 이 시점에서 관리자들이 “나 몰라라”하고 뒷걸음질 치면 결국은 그 화살이 직원을 향한 악성 민원으로 번져 조직전체를 시끄럽게 만든다. 관리자들, 잔불 회피하려다 대형화재 불러들이는 케이스다.
"…강성, 악성 민원인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아파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조직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남은 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퇴임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현직을 떠나며 남긴 소회다. 짧디짧은 이 메시지에서, 그의 자성(自省)과 아쉬움이 묻어난다. 다른 자리도 아닌 서울청장· 국세청 2인자 등 최고 관리직에 있었음에도 허약한 조직시스템을 손보지 못한 독백이자, ‘자리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恨)으로도 읽혀진다. 후임 관리자들이 임 전차장의 퇴임사를 다시한번 되새기며 자문자답해 봤으면 싶다. “그 관리자는 왜 그 자리에 있나”라고…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